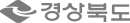공간안내
문화로 만드는 청년행복시대, Y-STAR프로젝트
대관신청현황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5
- 작성일 : 2025-07-24
Gye-dong in Le Corbusier





우주적 조형 감각의 탐색: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꼬르뷔제, 그리고 르꼬르 피자의 인체 비례 실험에 대한 조형미학적 고찰
동시대 회화에서 조형의 의미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존재의 질서, 비례, 감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철학적 매개로 작용한다. 작가의 작업은 바로 이 조형의 근원적 문제에 천착하며, 비례의 미를 통한 인류 보편성과 민족 혹은 행성적 특이성 간의 긴장을 탐색한다.
작가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 주목하면서, 인체 비례라는 고전적 이상이 인간 중심적 미의 규범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성찰한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근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모듈로(Modulor)’ 시스템으로 시선을 옮긴다.
르꼬르뷔제의 인체 비례도는 더 이상 고전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을 산업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하는 제스처였다.
특히 작가는 이 인체 이미지에서 ‘약간은 외계적인 조형성’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조형적 본질이 특정 시대나 민족을 넘어서 다른 환경(심지어 행성적 환경)에서도 변용될 수 있음을 직관한다.
그의 사유는 민족마다 다른 색채 감각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환경적 결정론의 미학적 확장으로 이어진다.
김창수 교수의 색채이론—‘민족의 색은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은 작가에게 지구를 넘어선 미의 개념, 즉 ‘우주적 조형미’로의 비약을 가능케 한다.
지중해의 하늘색, 조선의 황토색, 이러한 ‘환경적 미학’은 각 지역의 문화적 미의식을 형성하듯, 다른 행성의 자연환경 역시 전혀 다른 비례, 색, 형태를 낳을 수 있다는 상상력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작가는 조형이라는 개념을 단지 시각적 구성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질감, 형태, 색채, 공간 구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감각 시스템’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르꼬르 피자’라는 가상의 외계 생명체 캐릭터는 단지 회화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과 비(非)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조형적 화자이다.
이 존재는 작가가 정의한 ‘지구적 조형미’의 혼합체로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공, 지구와 우주 간의 융합을 표상한다.
결국 그의 회화는 단지 스타일이나 양식의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비례’라는 보편성과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미학적 지점에서 탄생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회화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아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의 이미지-생성 패턴이나,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철학을 소환할 만큼, 인간 형상의 재해석과 감각 질서의 재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와 같은 조형 실험은 단지 외계적 기괴함의 시각화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미의식과 지각의 경계를 질문하는 회화예술의 오늘을 예고한다.
작가의 작업은 인체 비례라는 근대적 질서의 해체 위에,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쌓아올리는 ‘탈지구적 조형미’의 기획이며, 이는 21세기 회화예술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은유적 항로가 될 수 있다.
「우주의 눈으로 조형을 보다」
작가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 주목하면서, 인체 비례라는 고전적 이상이 인간 중심적 미의 규범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성찰한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근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모듈로(Modulor)’ 시스템으로 시선을 옮긴다.
르꼬르뷔제의 인체 비례도는 더 이상 고전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을 산업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하는 제스처였다.
특히 작가는 이 인체 이미지에서 ‘약간은 외계적인 조형성’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조형적 본질이 특정 시대나 민족을 넘어서 다른 환경(심지어 행성적 환경)에서도 변용될 수 있음을 직관한다.
The artist draws attention to Leonardo da Vinci’s Vitruvian Man, a pinnacle of Renaissance humanism, to reflect on how classical ideals of proportion shaped human-centered aesthetics. He then turns to Le Corbusier’s Modulor system, which repositions the human figure within the functional and universal logic of industrial society. In this transition, the artist perceives an “alien-like” form, intuitively suggesting that the essence of human form can transform across cultures—and even planetary environments.
이 통찰은 작가로 하여금 지구를 넘어선 ‘우주적 조형미’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이 고유한 미의식을 형성하듯, 다른 행성의 환경 또한 전혀 다른 비례와 색,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This insight leads the artist to envision a "cosmic sense of form" beyond Earth. Just as natural environments shape aesthetic sensibilities on Earth, other planets could give rise to entirely different proportions, colors, and forms.
The artist explores Leonardo da Vinci’s Vitruvian Man to reflect on how classical ideals of proportion shaped human-centered aesthetics. Shifting to Le Corbusier’s Modulor, he considers how modern design positioned the human figure within industrial logic. Notably, the Modulor’s form appears somewhat alien, prompting the artist to imagine how human proportions might vary across cultures—or even planets—shaped by environmental differences. This expands the idea of beauty beyond Earth, suggesting that form and proportion are not fixed but fluid, influenced by both culture and context.
작가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 주목하면서, 인체 비례라는 고전적 이상이 인간 중심적 미의 규범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성찰한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근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모듈로(Modulor)’ 시스템으로 시선을 옮긴다. 르꼬르뷔제의 인체 비례도는 더 이상 고전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을 산업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하는 제스처였다. 특히 작가는 이 인체 이미지에서 ‘약간은 외계적인 조형성’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조형적 본질이 특정 시대나 민족을 넘어서 다른 환경(심지어 행성적 환경)에서도 변용될 수 있음을 직관한다.
근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모듈로(Modulor)’ 시스템으로 시선을 옮긴다. 르꼬르뷔제의 인체 비례도는 더 이상 고전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을 산업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하는 제스처였다. 특히 작가는 이 인체 이미지에서 ‘약간은 외계적인 조형성’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조형적 본질이 특정 시대나 민족을 넘어서 다른 환경(심지어 행성적 환경)에서도 변용될 수 있음을 직관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조형이라는 개념을 단지 시각적 구성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질감, 형태, 색채, 공간 구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감각 시스템’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르꼬르 피자’라는 가상의 외계 생명체 캐릭터는 단지 회화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과 비(非)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조형적 화자이다. 이 존재는 작가가 정의한 ‘지구적 조형미’의 혼합체로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공, 지구와 우주 간의 융합을 표상한다.
결국 그의 회화는 단지 스타일이나 양식의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비례’라는 보편성과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미학적 지점에서 탄생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회화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아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의 이미지-생성 패턴이나,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철학을 소환할 만큼, 인간 형상의 재해석과 감각 질서의 재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와 같은 조형 실험은 단지 외계적 기괴함의 시각화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미의식과 지각의 경계를 질문하는 회화예술의 오늘을 예고한다. 작가의 작업은 인체 비례라는 근대적 질서의 해체 위에,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쌓아올리는 ‘탈지구적 조형미’의 기획이며, 이는 21세기 회화예술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은유적 항로가 될 수 있다.
작가는 조형을 시각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질감·형태·색채·공간을 아우르는 감각적 총체로 이해한다. ‘르꼬르 피자’라는 외계적 존재는 동서양, 자연과 인공,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형적 상징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닌, 보편성과 특수성,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미학적 융합이다. 아비 바르부르크의 이미지 생성 이론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철학처럼, 작가는 인체 비례의 근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각 구조를 재구성하는 ‘탈지구적 조형미’를 탐색한다.